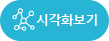| 항목 ID | GC09101372 |
|---|---|
| 영어공식명칭 | Jaesugunnorae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권미숙 |
| 채록 시기/일시 | 1981년 8월 1일 - 「재수굿노래」 조심봉에게서 채록 |
|---|---|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0년 - 「재수굿노래」 『상주시사』 4권에 수록 |
| 채록지 | 병암리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병암리
|
| 가창권역 |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
| 성격 | 무가 |
| 기능 구분 | 의식요 |
| 형식 구분 | 독창 |
| 가창자/시연자 | 조심봉 |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에서 전하여 오는 무가.
[개설]
재수굿은 집안의 안녕함과 자손의 번창, 그리고 가족의 장수와 다복을 비는 무속 의례이며, 경사굿·안택굿이라고도 한다. 죽은 이의 영혼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지노귀굿과 달리, 산 사람의 복을 집안 단위로 비는 굿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전승되는 「재수굿노래」는 이러한 재수굿을 할 때 사용되는 무가이다.
[채록/수집 상황]
상주시에서 전승되는 「재수굿노래」는 1981년 8월 1일 지금의 공검면 병암리 북촌마[마을]에 살던 제보자 조심봉에게서 채록하였으며, 2010년 상주시에서 간행한 『상주시사』 제4권 452~453쪽에 실려 있다.
[구성 및 형식]
「재수굿노래」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독창으로 부르며, 가창자가 굿을 하는 집안의 사정에 따라 사설 내용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부른다.
[내용]
병암리에서 채록된 「재수굿노래」는 “상주군을 접어들 때 공검면을 접어들어”라고 하여 굿을 하는 집의 위치를 먼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후렴구는 없지만 사설 중간마다 “당아”라는 말을 넣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대한 나라 한이새요 대한 나라/ 점령하야 산천지에 후천지는 억만 세계/ 모범이라 수지조정 은나서예 우리나라/ 대한나라 조선 한국 생겼으니 경상북도/ 돌아들어 상주군을 접어들 때 공검면을/ 접어들어 동네 정면 늘밤에다 대동안을/ 점령할 때 국사봉에 신령님네 용문산/ 산신님네 오봉산 산신님과 고들바우/ 미륵님네 신수바우 미륵님네 약사여래/ 약사도사 요황님께 하회동실 일모동창/ 하실 적에 금년 해우는 신유년이요 달수로는/ 칠월상달 칠월상달 오늘날로 초이틀에/ 생사생기 하니시요 불법 지자 대명당에/ 오신 손님 이 좌석에 앉아서러 이 제자에/ 아 얻는 소리 듣자 하야 글로 두고 오났니/ 금일 저녁 좋은 발은 뜨리오니 우리 당아/ 명남돌이 대도리에 우리 북천마라 대동안에/ 앞도 당산 수굴매기 뒷도 당산에 발보살님/ 사천왕에 문을 열 때 당아 마가정중 오복이요/ 명당마중 재수 줄 때 불법 제자 이 공자는/ 하루 일기 다 못 외고 세상 분별 다 못 외고/ 하나님은 아버지 지하국은 어먼님네/ 아니시요 일곱 칠성 칠성님네 명산대처/ 산신님네 이십팔소 사난대신 동서야 남북에/ 요황님네 하와동시 밀모동참 나실 적에/ 대한국에 점령하야 불법 제자 내여실 땐/ 무슨 일을 모르리 우리 선신 제자/ 방방곡곡 다 댕기고 면면촌촌 다 댕길 때/ 억조창생 만민들을 건즈낼 때 죽는 중생/ 살려 주고 병든 중생 곤쳐 주고 소원자에/ 소원 줄 때 없는 자궁은 생남 생녀를 부라 주고/ 있는 자궁은 일추월장 길러 주고 약한 자는/ 선심 복록 내라 주고 선인자는 만복록을/ 점지하시고 양모쪼록 가신나만 당아/ 억조창생 만민들은 하나같이 건지실 때/ 하늘 아래 사는 중생 하석먹는 중생들을/ 하루에도 열천 가지 죄를 져고 백만 가지/ 죄를 졋네 이 죄목은 낱낱이도 몽아다가 당아/ 동서남북에 소멸하고 선심 복록 선인 복록/ 만복록에 후이기여 아름답기 주실 적에는/ 이복아들을 당아 하늘 아래 사는 중생/ 이 중생들 하나 같이도 건지 내고 하나같이/ 도와실 때 금년 해운 시 당아 오만 년의/ 운이 되야 우리나라 대한국에다 방방곡곡/ 노인이로다 당아 노인 모아 공덕 주고/ 당아 중년 모아 하련하야 억조창생/ 만민들을 건지 내니 대중생을 대해 주고/ 억조창생 만민들을 한맘 한뜻 아무쪼록/ 가시나 우리나라 대한 나라 임금님네/ 백성 몸이 한몸에 한뜻으로 알뜰살뜰/ 해여 가이고 만복록에 부귀 공명 대대로도/ 영광이니 주옵소사 나무아미타불 오십삼불/ 부처님네 관세음보살 부처님네 서가여래/ 노자님네 미륵존불 시주님네 하와동심/ 밀모동참하옵소사.”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재수굿은 정초 또는 봄·가을에 하는데 굿 날짜는 가족의 생기복덕(生氣福德)에 맞추어 결정한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에는 재수를 빌기 위하여 특별히 굿을 하기도 한다.
[현황]
사회가 변함에 따라 재수굿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수굿노래」의 전승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재수굿노래」는 신과 인간을 고루 대접함으로써 집안의 편안함과 다복함을 계속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상주시사』 (상주시, 20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