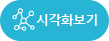| 항목 ID | GC09101354 |
|---|---|
| 한자 | 雙花祭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박은정 |
| 수록|간행 시기/일시 | 2010년 11월 30일 - 「쌍화제」 상주시에서 간행한 『상주시사』 4권에 수록 |
|---|---|
| 관련 지명 | 쌍화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
| 관련 지명 | SK엔크린 신광주유소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512[윤직리 709-12] |
| 성격 | 암석 전설|지명 유래 전설 |
| 주요 등장 인물 | 마을 사람들|동네 처녀들 |
| 모티프 유형 | 암석 신앙|암수 바위 |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서 동제인 쌍화제와 관련하여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개설]
「쌍화제(雙花祭)」는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암석 전설이며, 바위와 관련하여 마을의 이름이 지어진 내력을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이기도 하다. 바위에 동제(洞祭)를 올리게 된 유래와 동제의 과정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채록/수집 상황]
「쌍화제」는 2012년 11월 30일 상주시에서 간행한 『상주시사』 4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채록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내용]
상주시 함창읍사무소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신경주(申京注)의 집에는 수령이 150여 년 된 회나무가 있는데, 회나무 아래에 높이 2m 조금 넘는 바위가 있었다. 바위는 소나무 가지로 덮여 마을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었다. 원래는 세 개의 큰 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었으나 1920년 무렵 새로 큰길을 내면서 두 개가 매몰되었다고 한다.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위에 동제를 올렸다.
바위를 연유로 하여 마을 이름은 ‘삼암리(三岩里)’ 또는 ‘쌍화(雙花)’라 불렸다. 삼암리라는 이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음매’, ‘시아매’로 변형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순조(純祖)[1790~1834] 대 마을에 있는 단양 조씨(丹陽 張氏) 집안에서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 자리까지 올랐다. 이를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 핀 것에 비유하여 마을이 쌍화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뒷산에 두 기의 묘가 있다.
원래 세 개의 돌이 있을 때는 마을에 별다른 재앙이나 화재가 없었는데, 두 개의 돌이 도로에 묻힌 후부터는 마을에 흉흉한 일들이 생겨났다. 마을에서 행하여 오던 동제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제를 지내지 않은 이듬해부터 정월이면 매일 재화가 발생하고 마을 처녀들이 가출하는 일이 생겨 마을에 피해와 근심이 그치지 않았다. 정월에 발생하는 불은 담벼락에서 발화하여 행랑채나 마구간 등 부속 건물에 옮겨 붙었다가 쉽게 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이 이웃집으로 번져 하룻밤에 일곱 차례나 큰 불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기이하게도 큰 채에는 옮겨 붙지 않는 다행스러움도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불이 나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 불을 끄기 위하여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불길이 끊이지 않은 채 날이 밝아오니 사람들은 도깨비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동네 처녀들이 가출하는 일을 예방하지 못한 채 몇 해를 넘기게 되자 재앙을 피해 보려는 마음으로 중단했던 동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동제는 매년 정월 14일 밤 11시부터 시작한다. 회나무 아래 숨겨져 있는 큰 돌에서 제례를 먼저 올린 다음, 가가호호 빠짐없이 소지(燒紙)를 사르며 마을의 평안과 발전을 빈다. 동제는 새벽녘이 되어야 끝난다.
제관은 허물이 없고 생기복덕(生氣福德)이 있는 사람 세 명으로 정한다. 제관을 ‘주판’이라고 하며, 제물을 장만하는 집을 ‘주판집’이라고 한다. 여느 지방의 풍습과 마찬가지로 주판은 상가 출입과 남녀 관계를 금한다. 제례 당일에는 목욕재계하고 직접 시장에 나가 과일, 어물, 쇠고기, 고급 술 등 제물을 구입한다. 음식도 주판집에서 장만한다. 마을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금줄을 치며, 각 가정과 골목, 우물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제기도 정성 들여 닦아 준비한다. 동제가 끝난 보름날 아침에는 온 동민이 모여 제례 음식으로 음복을 하고, 1년의 마을 살림살이를 의논한다.
마을에 불이 나고 처녀들이 가출하는 것은 암돌을 남겨 두고 땅에 묻힌 숫돌의 한 맺힌 사랑이 불로 나타나 암돌을 유인하여 마을에서 끌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불같은 사랑이라 하여 ‘쌍화(雙火)’라 하다가 보다 아름답게 ‘쌍화(雙花)’로 쓰게 되었다. 쌍화제는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빌고 동시에 연정을 품고 묻힌 바위에 대한 위로가 담긴 제사라고 할 수 있다.
2003년경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회나무 아래 있던 바위는 큰 제를 올린 뒤 윤직리의 SK엔크린 신광주유소 앞 소공원으로 이전하였다.
[모티프 분석]
「쌍화제」의 주요 모티프는 ‘암석 신앙’과 ‘암수 바위’이다. 암석 신앙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 또는 인공적으로 다듬은 바위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신앙을 말한다. 암석 자체가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바위의 불변하는 영속성 때문에 바위를 신이한 사물로 인식하기도 한다. 암석 신앙의 대상이 되는 바위 중에는 암수 바위도 있다. 보통 암수의 바위가 서로 떨어지면 마을에 재앙이 생기고,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동제를 지낸다. 「쌍화제」에서는 암돌과 분리되어 매몰된 숫돌이 한을 품어 마을에 변고가 생기고, 숫돌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동제를 지낸다.
- 『상주시사』 (상주시, 2010)
-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국립민속박물관, 2012)